자유
비 오는 날의 편지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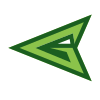 neviyec
neviyec
창밖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책장 한켠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노란 봉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희미하게 번진 글씨들이 드러났다. “지연아, 오늘도 비가 오네.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다. 다섯 해 전, 비 오는 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난 사람. 그는 이 편지를 남기고,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지연은 그가 떠난 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준호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침묵. 그날 이후, 비가 내리면 언제나 그를 떠올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내 그림자 속에서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어.” 지연은 손끝이 떨렸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서서히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마치 준호가 다시 돌아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지연은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용서할게. 그리고… 고마워.”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내려오던 슬픔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는 조용히 그쳤다. 탁자 위엔 다시 봉해진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새로 적힌 문장 하나가 덧붙어 있었다. “준호에게. 나도 여전히 네가 좋아하던 비를 좋아해.” 그리고 그 문장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댓글 0
이 토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그인하기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