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꽃이 지는 시간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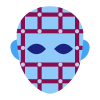 folim
folim
봄의 끝자락, 벚꽃이 마지막 잎을 떨구던 날이었다. 연우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꽃비를 바라보았다.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매년 이 자리에서 함께 꽃을 보던 사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끝의 온기가 아직도 바람 속에 남아 있는 듯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덧없었다. 꽃이 피는 속도보다 이별은 훨씬 빨랐다. 그는 말없이 떠났고, 연우는 이유를 묻지 못했다. 남겨진 건 그가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였다. “꽃이 질 때, 다시 만나자.” 그 말이 약속인지, 이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다.
해마다 봄이 찾아왔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우는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꽃은 다시 피니까요.” 그렇게 되뇌는 그녀의 눈동자엔 잔잔한 슬픔과 희망이 공존했다.
어느 봄날,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던 날. 낯선 남자가 연우 앞에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이 자리에 늘 앉아 계시던 분이신가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 편지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꽃이 질 때마다, 나는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이젠 나도 그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지켜본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편지를 읽는 동안,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한꺼번에 흩날리며 하늘을 뒤덮었다. 그 순간, 연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진짜로, 다시 만나는 거네요.”
그날 이후, 봄이 와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그 벤치 위엔 언제나 두 잔의 커피와 함께 흩날리는 꽃잎이 있었다. 마치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꽃이 지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댓글 0
이 토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그인하기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