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작가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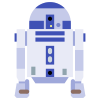 joshuamichael
joshuamichael
고요한 정원, 대나무 숲은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 펼쳐진 옅은 분홍빛 비단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흘러내린 흔적 같았다. 누가 이곳에 머물렀던 것일까. 흔들리는 대나무와, 가지 끝에 맺힌 이슬 사이로 오래된 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것은 말 없이 남겨진 사랑의 잔상이었다.
비단 위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곱게 수놓인 꽃무늬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위로 떨어진 한 줄기 햇살조차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날, 누군가는 여기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렸을 것이다. 혹은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조용히 돌아섰을지도 모른다. 남겨진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나무는 오래 전부터 진실을 품는 나무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그 속삭임을 들으려 애썼다. 슬픔은 때때로 화려함 속에 숨어 있었고, 그 진실은 조용한 아름다움 속에 깃들어 있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결국 전해지지 못한 마음. 그것들이 이 공간에 남아, 한 줄기 슬픔으로 가만히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자주 눈에 보이는 이별만을 기억하지만, 이처럼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슬픔이 더 깊을 때가 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혹은 영영 전할 수 없는 말을 위해 우리는 마음 한 귀퉁이에 그늘 하나를 남긴다. 그늘 아래, 우리는 조용히 성장하고, 조용히 추억을 품는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비단을 펼치듯 그 기억을 꺼내어 쓰다듬게 된다.
해가 저물 무렵, 바람이 다시 불었다. 비단은 천천히 흔들렸고, 대나무는 속삭이듯 울었다. 그 아래, 누군가 남긴 감정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끝끝내 지켜낸 사랑이었다. 눈물로 쓰이지 않았지만, 조용히 스며든 이야기. 대나무 아래 비단과 슬픔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댓글 0
이 토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그인하기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