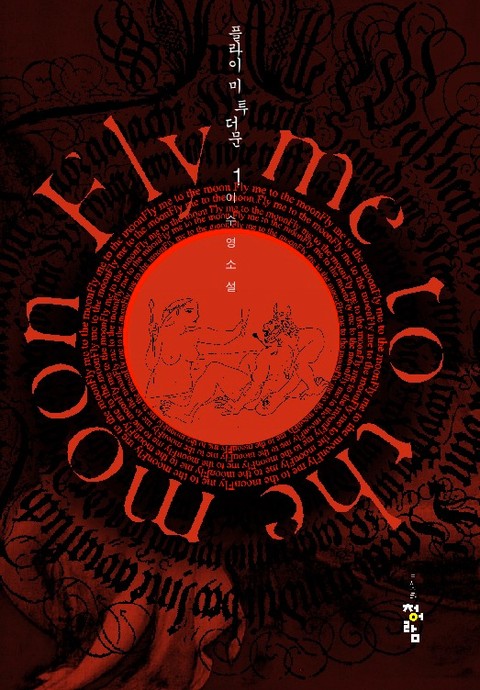수비 LV.21
작성리뷰 평균평점
평점 4.5 작품
4.2 (5)
그 길의 끝에서그대를 찾아가다사랑을 그리워하는 남자, 윤.사랑을 두려워하는 여자, 지수.“사랑해.” “…….” “사랑해.”윤이 열 몇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을 때, 지수는 저도 모르게 힘껏 그를 밀쳐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라는 걸 안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할 그 소중한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는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사랑해.」하지만 윤의 목소리는 좀처럼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지 '미로'는 15세이용가로 재편집한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반짝반짝(박수정 作)’과 연작입니다.#일러스트 : Cierra
4.5 (1)
재형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급 훈남이다. 그러나 아홉 번째 여친 길은은 재형의 뻔한 러브 스토리를 조용히 뒤흔든다. 이건 뭐지? 재형은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낯설다. 이제 곧 군대도 가야 하는데 알면 알수록 길은을 모르겠다. 얼마나 더 알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사랑은 흥미진진한 고찰이 된다. 그런 고찰이 그들의 사랑을 어디로 이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글 중에서>전화가 끊겼다. 순간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허무하기도 하고,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도 같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여자들과 사귀는 동안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고 피곤할 정도여서 이쪽에서 그만두고 싶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지가 뭔데 전화를 먼저 끊어?/휴우, 간신히 재형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맞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드렸다. 겨울 밤 하늘이 까맣고 멀다. 내겐 재형이가 꼭 밤하늘 같다.
4.5 (1)
“그때, 왜 나한테 뽀뽀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헤프고 멋대로 들이대고 아무 데서나 잠드는, 그녀는 유쾌한 씨. 이름은 고남주. “대답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냐?” “그래? 알았어. 책임질게.” 헌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남 일에 신경 끄고 싶은데 한눈에 찍혀 버린 까칠한 전학생 도지완.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너를 기다렸어. 산이 울긋불긋 변하는 시간을 넘어 눈이 오는 시간을 지나 꽃이 피는 시간을 건너 매미가 우는 폭염을 견뎌 냈어.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뜨겁게 타오르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첫사랑. 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는 너를 만나러 가. 일 년을 꼬박 살아 내고 싶은 남주와 서러운 폭염을 견뎌 낸 지완의 기적 같은 이야기.
3.25 (4)
절벽 위에 외로이 있는 초가집 하나.그곳에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내가 유폐되어 있다.나는 병든 아비를 대신하여 그를 감시한다.어떤 이들은 그가 친모와 간음을 했다고 하고,다른 이들은 그가 수백의 처녀를 겁탈했다고 했다.하지만 소문과 달리, 내 눈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그저 외롭고 자상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얘, 아가. 우리 서로 이름 지어 주지 않으련?"이 양반이 미쳤나. 너무 외로워서 미쳐버렸나 보다.“네 이름은 호랑이 인에, 아름다울 화를 써서 인화라고 하자. 나도 하나 지어주렴.”“그럼 나리는 산이라고 하십시오. 산은 바다 위 홀로 떠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지 않습니까.”“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아가. 너는 시인이구나.”서로 이름을 짓자던 남자. 시를 읊어주고 혼자 농담을 하며 웃던 남자.이상하게도 점점 그의 목소리가 좋아졌다.점점 그가 좋아졌다."오늘은 자고 가련. 너무 외로워."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지만.“저희는 정말 안 될 말입니까?”그는 조금 웃더니 내 뺨에 입을 맞췄다.“그래. 안 될 말이란다. 네가 내 곁에 머물면 내내 괴로운 일들만 겪게 될 거다.”그래도, 그렇다고 해도,그는 내 정적 속에 열기를 피우는 유일한 존재였다.우리는 달과 해가 한 하늘에서 멀찍이 떨어져 순행하듯이서로에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로 떨어져 앉아,각자의 목숨을 조금씩 풍화시켜갔다.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본 도서는 15세이용가로 개정되었습니다.
4.12 (16)
<옷소매 붉은 끝동> 도깨비보다 무섭다는 왕이 있었다. 가늘고 길게 살고픈 궁녀도 있었다. 이상스레 서로가 눈에 거슬렸다. 그래서 다가섰다. 그래도 다가서지 않았다. 어렵고 애매한 한 발자국씩을 나누며 습관처럼 제자리를 지켰다. 알쏭달쏭한 시절은 기쁨과 배신으로 어지러이 물들어 이지러지고, 이별과 재회는 어색한 질투와 상실감을 동반하였다. 잊은 척은 할 수 있어도 잊을 수는 없었다. 이윽고 무너진 감정의 둑은 운명을 뒤흔들 홍수가 되었다. “내 천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너여야만 한다.” 하지만 선뜻 붙잡지 못할 붉은 옷소매가 달콤할 수만은 없고, 오히려 그 끝동은 오래도록 별러온 양 새침하게 밀고 당길 따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