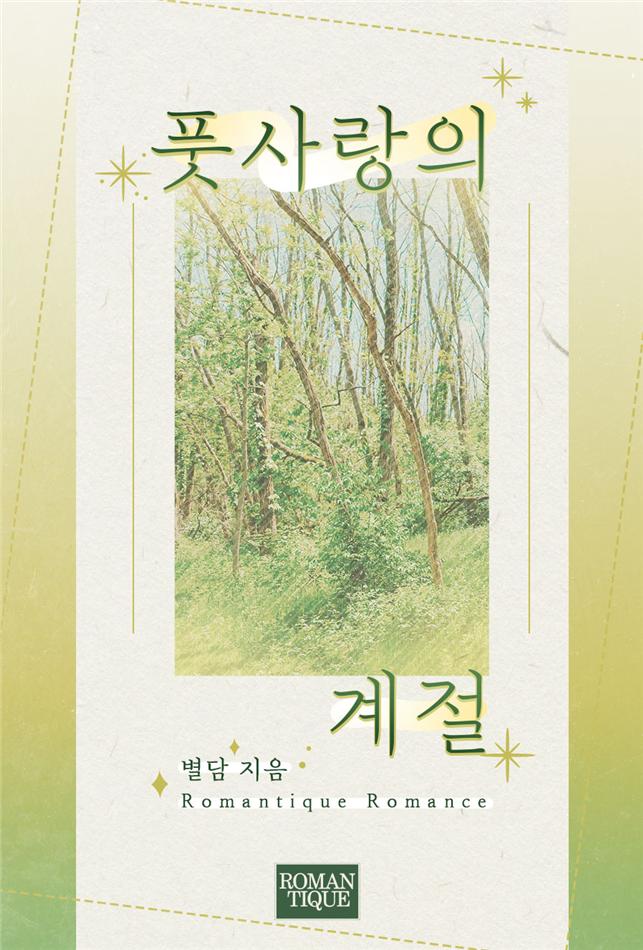별담
혹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이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다시 만났다. “오랜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8년 만에 소개팅 자리에서 재회한 첫사랑, 김유한과. “네 이름을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지 알아?” 8년 만에 다시 동네로, 그것도 옆집으로 돌아온 막역지우, 유강현.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예나 지금이나 잘생기면 다잖아." 세상 잘난 두 남자를 양옆에 세워둔 복에 겨운 나, 강이나.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자꾸만 평범했던 일상을 깨트리려 하는 두 남자였으니까. “난 너에게 그저 스쳐 지나갔던 옛 동창으로 남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친구로 안 보고 있거든.” 두 남자의 열렬한 감정은 겨울잠 자듯 아직 깨어나지 않던 나의 연애 세포에 스위치를 켜, 활발한 반응을 일으켰다. 꺼진 줄로만 알았던 감정에 불을 지폈고, 시린 겨울 안에서 활활 타올랐으며, 태동이 시작되는 봄에 누군가에게는 잿빛으로 남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꽃으로 피어났다. 고작 20대 초반. 세상을 많이 살지도, 다양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청춘의 로맨스를 써 내려갔다. “사랑해.” 그 끝에 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