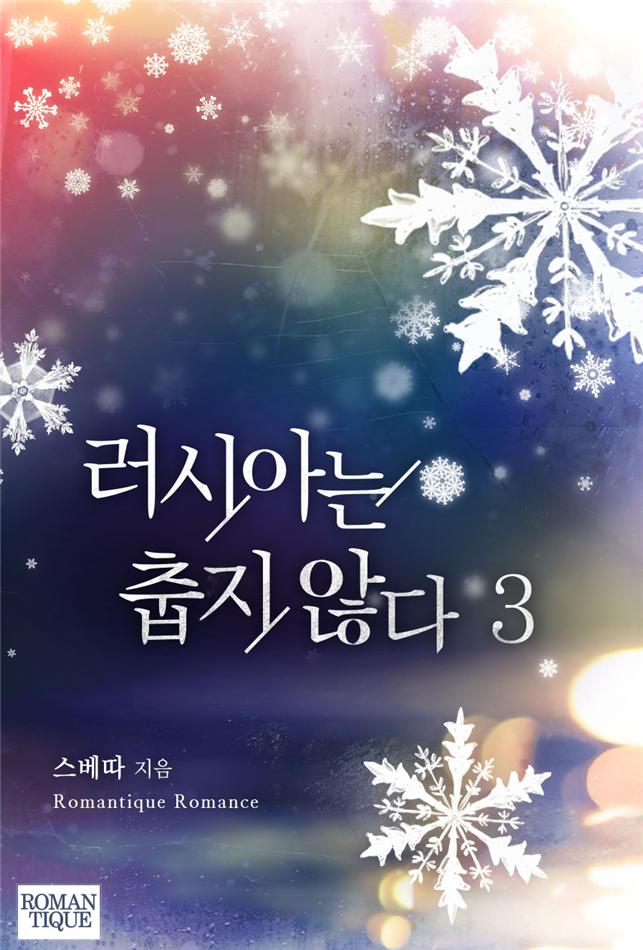스베따
평범한 직장 생활 중,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고 충동적으로 퇴사를 한 여자, 영지. 남들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권태롭기 짝이 없는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남자, 우영. 낯선 여행지에서 마주친다. * “우영 씨? 피곤ㅎ….” “난 한숨도 못 잤어요. 옆방에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자.” “그리고, 어제 영지 씨가 나 자라고 알려준 침대에서 잠들어버린 바람에 많이 곤란했다고요. 해결하기 전에도, 해결하고 나서도.” “네? 그게 무슨.” “하하. 생각 안 나는구나.” “…네. 음…. 어? 그러면 어떻게 난 내 침대에서 자고 있던 거죠?” “아.” 우영이 영지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다.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영지 씨가 편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발짝. “미안해요. 이렇-게 안아서 영지 씨 사용하는 방으로 옮겨다 줬죠.” “꺄악!” 어느새 우영의 얼굴에 웃음기는 없었다. “아, 알겠으니까 내려주세요.” “정말요?” “….” 우영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제 표정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마치 그 표정의 의미를 다 아는 것 마냥 영지의 눈이 감겼다. 이미 서로에게 드러나 있는 속마음을 감출 생각 따위 없어 보이는 두 입술이 빈틈없이 맞물렸다.
“함해율, 너랑 둘만 있고 싶어서.” “해율아, 너 미치게 달다.”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한번도 설렌 적 없어?” “네가 갖고 있던 내 이미지에서 친구는 빼 이제.” “뭐겠어, 남자지.” 갑자기 들이대는 이녀석. 평생지기, 엄마친구아들, 남사친의 끝 박찬형. 얘랑 나. 친구사이 인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어? * “함해율 너 보면서 설레고, 닿고 싶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 “….” 연인 사이에 가질법한 마음을 친구로만 생각했던 찬형이 제게 품고 있었단 사실에 해율에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몰려왔다. 친구라기엔 가족에 더 가깝다고 우리. 진짜 진심인 것 같은 그의 말투와 눈빛에, 해율이 느낀 감정 중 가장 큰 것은 미안함이었다. “한. 상병 달 때쯤부터인가.” “…구, 군대에서 그런 거면. 너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가보다, 야.” 이성으로서의 찬형을 제가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물론 찬형이 같이 학교에 다니는 내내 꾸준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키, 얼굴, 몸, 성격, 목소리.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남자였다. 문제는 그래서 해율이 매력을 느끼느냐였는데. “그게 아니란 건 내가 알아.” “다시 잘 생각해 봐.” 그걸 알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한대도 나는. 함해율 너. 정말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