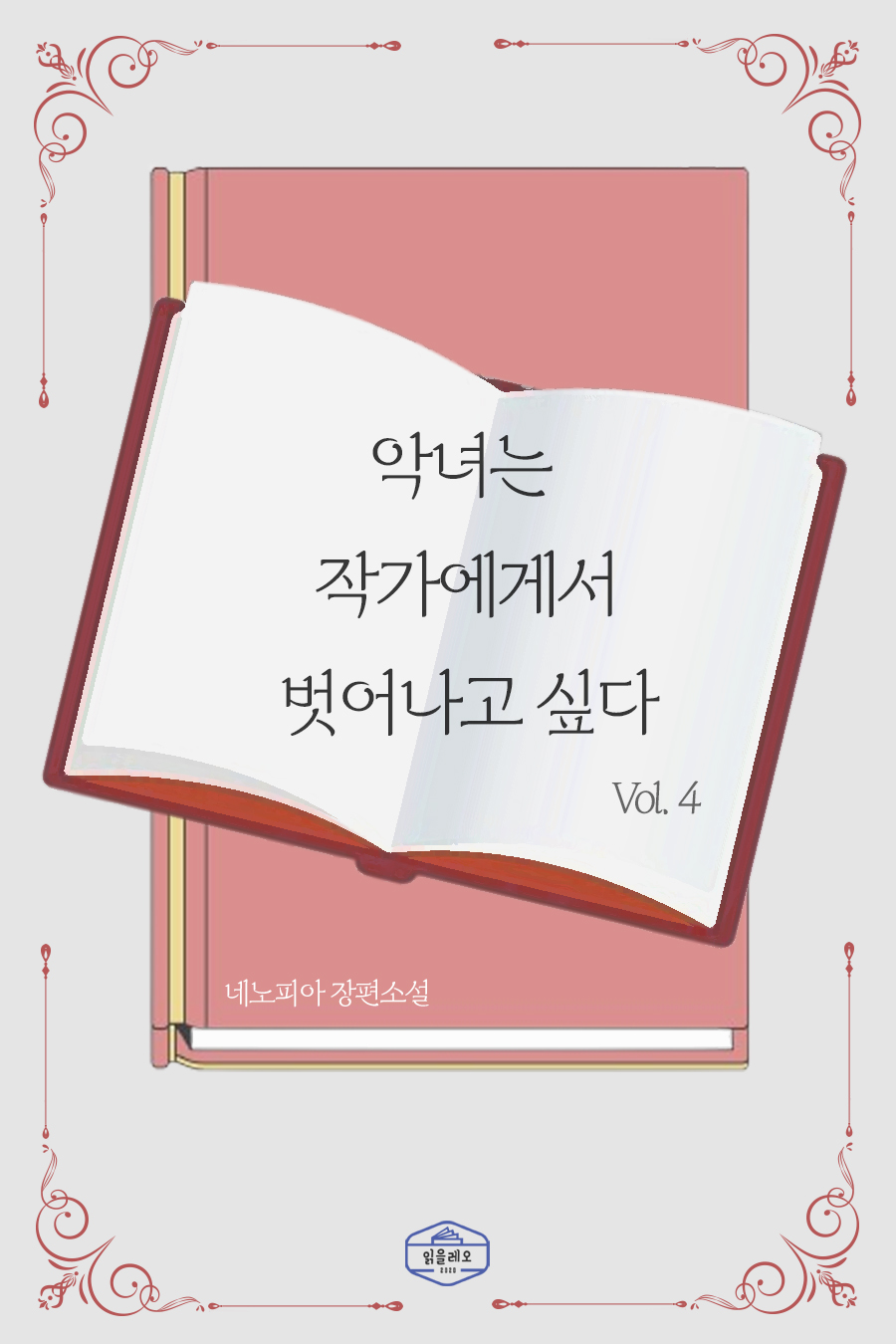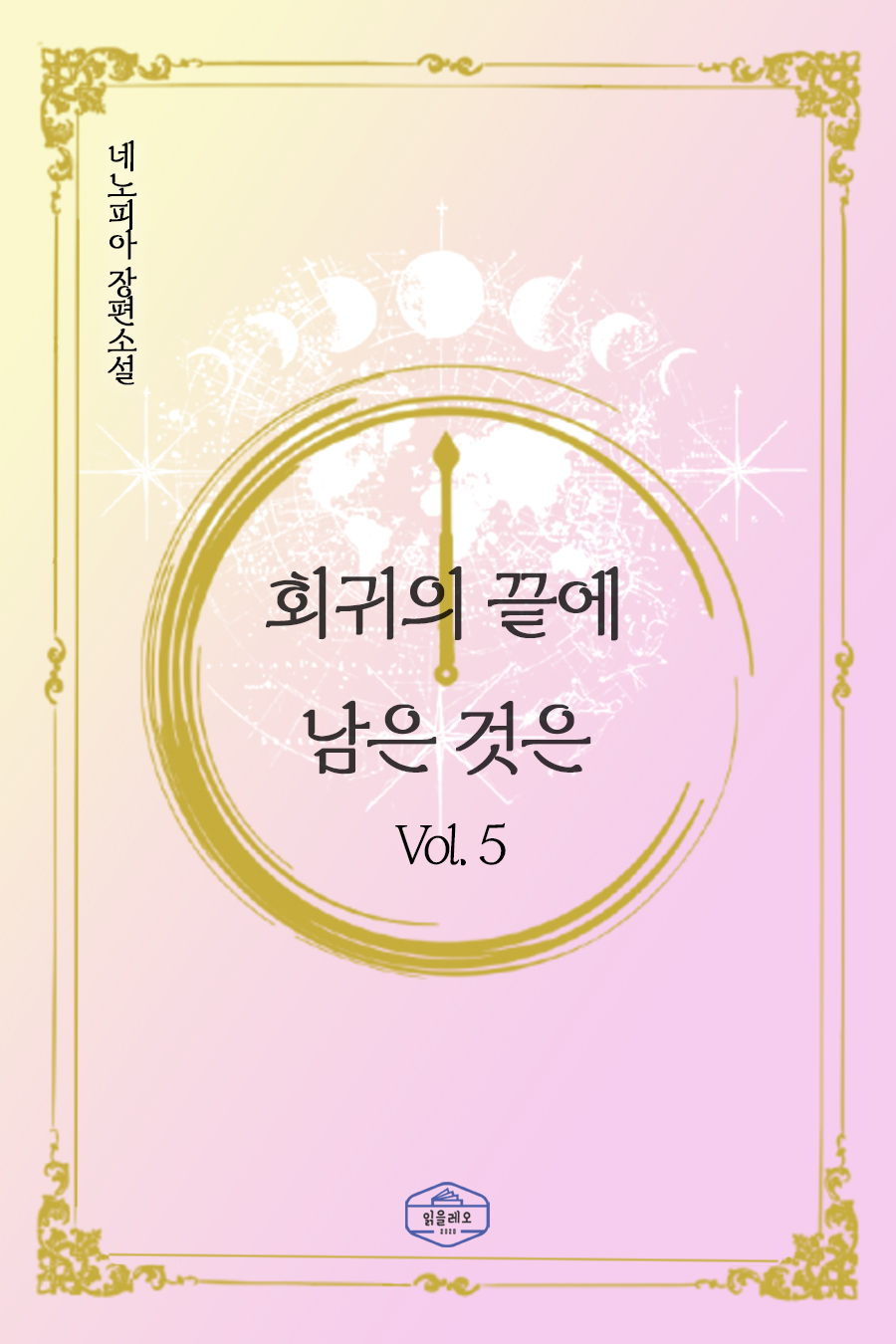네노피아
벗어나고 싶었다. 학창 시절의 누명과 그때의 기억들과, 짜여진 이야기 위에서 놀아나는 것으로부터. ……하지만 나는 그런 작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안 되나 봐. 그것이 나를 목표로 두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며 떠올린 마지막 생각이었다. ***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한참 힘들었을 때 아무렇게나 골라 읽었던 소설이라 그렇다. 아무튼, 제목은 기억나지 않아도 소설 속의 주조연들 정도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설에 나왔던 주인공의 이름이 오르네비아 넬라르였다. 그래, 내 눈 앞에서 노발대발하는 아미테르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말이다. 아니, 그거야 백 번 양보해서 일단 그렇다 치자. 문제는 내가 ‘레오시네’에게 빙의했다는 거다. ……하필 빙의를 해도 이런 악역이라니. 참으로 내가 겪었던 삶과 비슷했다. 무슨 짓을 해도 누군가가 깔아둔 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가. 절로 헛웃음이 터졌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는 침대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악몽이라도 꾼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탓에 보라색 머리카락이 들썩거렸다. ‘……또.’ 또 돌아왔다.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에게 죽어서. 몇 초 전에 찔렸다가 회복된 곳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하지만 린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었기에, 또한 익숙한 일이었기에 애써 기억을 밀어 넣었다. 숨을 잘게 나눠 뱉자 떨림도 차차 줄어들었다. 열댓 살의 어린아이치고는 퍽 태연한 태도였다. 그러나 린나는 개의치 않고, 어둠이 내려앉은 자신의 방을 아무렇지 않게 거닐었다. 100번을 넘는 삶을 똑같이 반복해오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동요는 우스운 일이었다. ‘이번이, 101번째인가?’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실소를 흘렸다. 이 뭣 같은 생이 벌써 100번이나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기대조차 없던 신에게 자그만 기대를 품고 또 실망해버린 제가 우스워서. 하지만 린나는 곧 제 상황에 체념했다. 무얼 하든 이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방증으로 제가 또다시 7년을 거슬러 돌아오지 않았나. 이 반복이 100번으로 끝날 줄 알았다. 죽고 살아나길 반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100번의 삶을 버텼다. 하지만 그 고통스런 100번의 삶 끝에, 변하는 것은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죽음을 바라는 일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