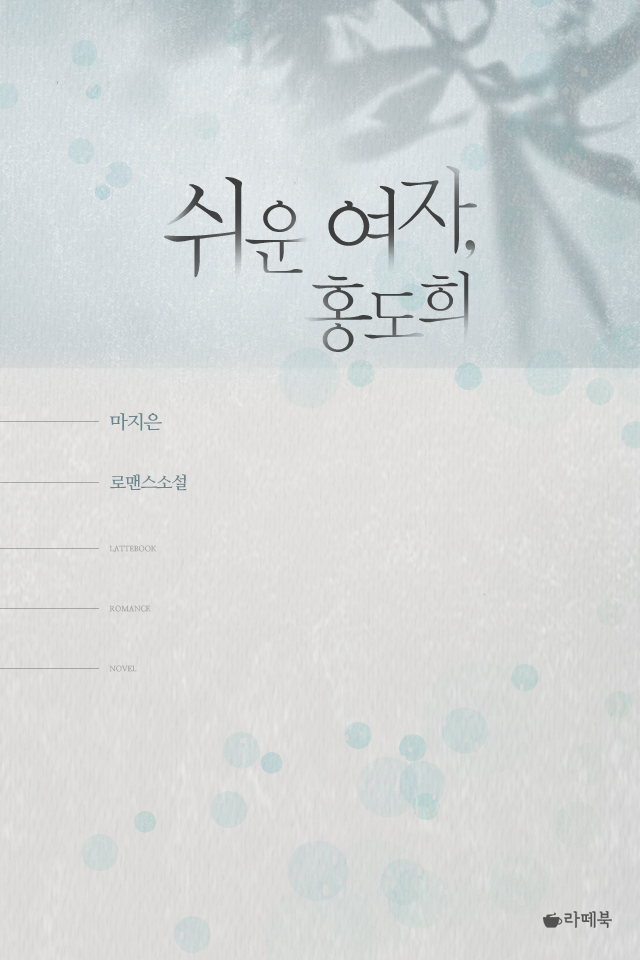마지은
대한민국 최고의 태한 그룹 외동아들인 사도현. 무엇하나 관심 없던 시시하던 그에게 관심거리 하나가 생겼다. 늘 냉기를 품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 “원하는 게 뭐야?” “역시. 똑똑한 애들은 눈치도 빨라.” “헛소리 집어치우고 원하는 거나 말해.” “네 몸.” 도현의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을 사납게 받아치는 수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수정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그녀를 갖기로 했다. “정확하게 졸업식 당일까지야. 그때까지 내가 호출하면 여기로 와.”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정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도도한 이수정이 겁을 먹고 떨고 있다. 짜릿했다. 약속 기한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졸업을 할 때까지였다. 그 시간 동안 도현의 마음 안에서 수정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안녕, 사도현.” 평소와 같았던 인사였을 뿐인데, 도현은 이상한 기분에 한 번 더 수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이대로 끝을 낼 수는 없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찾아야 했다. 사랑을 깨달은 남자의 후회, <내가 나빴다>
해강에게는 진오가 전부였다.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며, 울타리였다.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그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터였다. “5년. 5년만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사랑해, 해강아.”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친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돌연 고해진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뀔 줄이야. 재회를 기약한 약속도 몇 달 되지 않아 덧없이 무너지며, 해강은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11년 후, 한 호텔에서 객실 점검원으로 일하던 해강의 앞에 그가 다시 나타난다. 모셔야 할 본사의 부사장이 되어. 그런데…, "부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굳은 입을 열었을 때, “이해강 씨, 몇 년생입니까?” “네?”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식이 먹힙니까?” 해강은 환한 미소 대신 비소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 존재 자체가 잊힌 것만 같던, 경영대의 구석진 강의실. 혼자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무감한 얼굴의 남자는 은오와 눈을 맞춘 채 느리게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았다. 길게 빨아들인 담배 끝이 붉게 타들어 갔다. 어두운 실내에서 붉은빛은 한층 짙고 선명했다. 남자를 보며 은오는 생각했다. 참 맛있게 빨고, 참 시원하게 뱉는다고. 연기가 무척, 달아 보인다고. “줄까?”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여자를 향한 질문은, 무료한 와중에 든 가벼운 충동이었다. 저런 순진한 얼굴로는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려나, 약간의 호기심이 곁들여진 가볍디가벼운 충동. “늘 여기서 피워요?” “피우면?” “다시 와 보게요.” 불청객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절박한 순간 은오가 내민 손을 잡아 주었다. 길어야 겨우 3개월, 겁도 없이, 무언의 합의하에 시작된 관계였다. 쓸데없이 애틋했던 순간이 그 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눈앞에 펼쳐진 4장의 사진, 그중에서 망설임 없이 집어 든 사진 한 장.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적당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문득 떠오를 때면 아직도 씁쓸한 저릿함을 남기지만. 그래 봤자 한때의 유희였던 여자. 여자의 자리는 늘 기억의 한구석이라 치부했는데. 네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딴 맘을 먹고 싶어지잖아. “오랜만이네, 이은오. 우리, 한번 볼까?” “불장난은 어려서 한때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으로 억지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꼭, 탈이 나니까.” “불이 붙긴 붙었었다는 말이네? 이런 건 나랑만 해. 이 결혼 하자, 은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