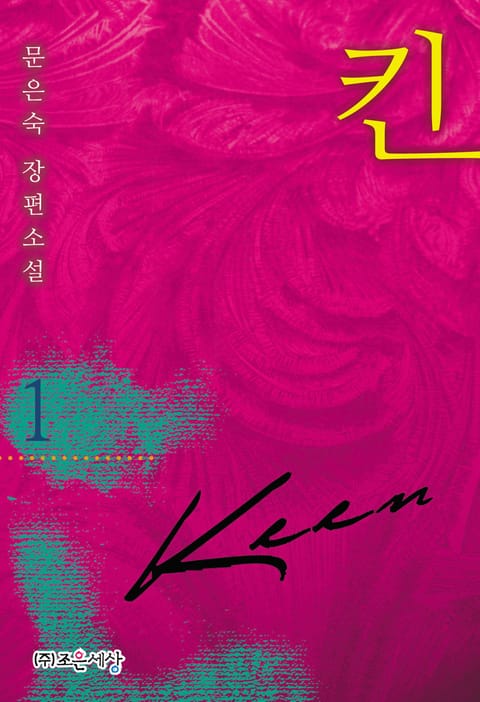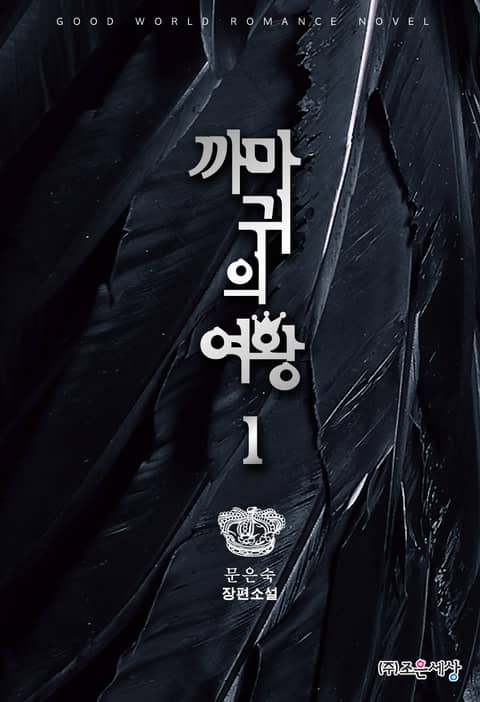문은숙 (Nana23)
<기담, 야행유녀> “침아야, 내 귀여운 아이야. 날 배신하지 마라. 꿈에서라도. 알겠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침아를 구하기 위해 료의 날개가 하늘을 누볐다. 첫 비행의 성공. 소년은 사내가 되어 넓은 하늘처럼 제 계집을 품고자 갈망한다. 꽃놀이의 밤. 술에 취하여, 꽃에 취하여, 사내의 뜨거운 정에 취하여, 한 조각 배 위의 침아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다.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복사꽃 그늘 아래 가득 찬 달을 중신아비 삼아 합환주를 나누었으니, 사내의 품에서 소녀는 여자가 된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채워진 정. 허나 본디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옛정을 어찌 잊으랴. 살아서 가없이 아껴주는 새로운 정과, 죽어서 서글픈 옛정의 회한.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래서 침아는 원추리 잎을 띄운 한 잔 물에 기원한다. “천년의 연정도 이 물과 함께 마르리라.”
<기담, 사미인(소책자 포함)> “못 보던 얼굴이다. 누구야?” 눈이 마주치자 선명하게 보였다. 새까만 홍채 속에 은빛의 파편들이 무수히 박힌 듯한 이질적인 기운. 분명하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보다 강하다. 개미보다 강한 것이 코끼리인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일의 발단은 두더지였다. 내 좋은 잠자리에 무모하게 침입한 것으로 부족해, 무척 아끼는 삼나무 뿌리를 갉아대는 통에 계속 잘 수가 없었다. 깨어서 그 녀석들을 혼내주고, 허기진 배도 채운 뒤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문득 아, 그렇지 하고 생각했다. ‘다가오는 춘분에 나는 사백 살이 된다.’ 생일을 기념하는 일은 그만둔 지 오래지만, 그 순간 무주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예전처럼 따스한 무주의 안개는 날 환영해주는 것 같았지만, 학교에 다니게 된 첫날 나는 교실에서 ‘그’를 보았다. 명(冥). 그것이 그의 이름. 그는 이름 그대로 환한 빛 속에 서 있는 암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