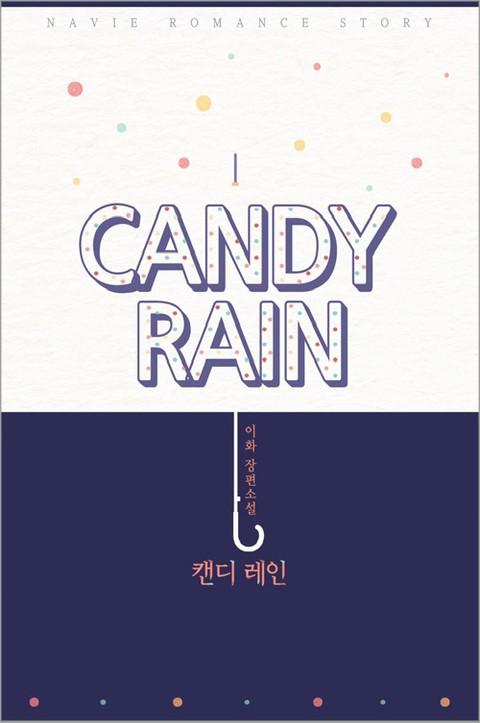이화
“왜 나한테 돌아왔어.” 태서는 내내, 그녀에게 투정 부리고 싶었다. 너 없는 시간들이 너무 무섭고 슬펐다고. “왜 이제 왔어.” 그 나쁜 계집애에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그 나쁜 계집애가 제발 좀 알아줬으면 했다. 아픈 말만 뱉던 채희만큼이나 아픈 말만 뱉었던 자신이 실은 그녀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쭉 곁에 있을게. 곁에 있을래.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네게 그럴 수 있나. 또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몸서리치게 겁이 나는 건 나인데. 새파란 하늘, 쏟아지는 햇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금빛 잎사귀. 몰래 훔치는 숨결.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였다. *해당 작품은 15세 이용가로 재편집된 도서입니다.
[오빠, 나랑 결혼하자! 결혼해서 여수에서 같이 살자! 서울 가지 마라아아아!] 어릴 적 청혼까지 하며 짝사랑했던 남자를 일하게 된 곳의 대표로 다시 만나게 된 태은. 아무리 세상이 넓고도 좁다지만 이렇게 그를 마주할 줄이야.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태은이라고 합니다.”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반가웠던 걸까. 정말 몰라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은척도 하지 않는 그가 야속하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다시 설레는 이 감정은 뭔지. 혼란스러운 감정에 태은은 일을 그만두기로 하는데……. * * * “그런데, 왜 그만둬?” “저 근무 첫날에 대표님이 그랬죠? 정 못 해 먹겠으면 언제든 상관없으니 말하라고.” “그랬, 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두렵다는 듯한 표정이다. “실은 저, 대표님만 보면 떨려요. 대표님 만지고 싶고, 자고 싶어요.” 할 생각 없는 고백이었는데, 무엇이 자신을 급발진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선 더 일 못 하겠어요. 못 해 먹겠네요, 정말.” 그게 이곳을 그만두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태은은 진심을 말했다. “누가 먼저 그런 말 하래.” 이제 그만 인사하고 미련 없이 가려는데, 그에게 팔목이 붙잡혔다. 당황해서 쳐다보니 그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 있었다. “나 좀 봐 줘.” “봐 주면 뭐 할 건데요?” “네 생각엔 뭘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뻔하네요.” “뻔해?” “나랑 자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맞아. 너랑 자고 싶어. 미치게.” 그의 긍정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얘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두서없이 밀려들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이만 가 볼게요.” “이태은.” “…….”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 “여기에서 못 끝내겠어, 나는.”
*본 작품은 리디 웹소설에서 동일한 작품명으로 15세이용가와 19세이용가로 동시 서비스됩니다. 연령가에 따라 일부 장면 및 스토리 전개가 상이할 수 있으니, 연령가를 선택 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인마? 누나한테 너?] [내가 누나한테 너라고 부른 게 한두 번이냐?] 열일곱의 마음에 담아 둔, 열아홉 첫사랑이 꿈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어느덧 자라, 도깨비 시장의 최고 매출을 자랑하는 ‘동네 수산’의 사장이 된 오대오의 눈앞에. “아…… 대오야, 안녕. 잘 지냈지? 오랜만이다.” 지난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으나, 그녀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달라진 건 그녀의 미소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가 미국을 떠나 돌아온 이곳에서 카페를 차린다는 걸. “누나 하려는 커피숍에 나도 붙여 줘요.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고 싶은 건데.” “나 하나만 물어도 돼요? 커피숍 이름, 정했어요?” “로켓 커피.” 그 순간 그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지켜 주겠다고 결심했다. 로켓 커피, 그녀의 모든 꿈이 담긴 곳이었으니까.
*본 작품은 리디 웹소설에서 동일한 작품명으로 15세이용가와 19세이용가로 동시 서비스됩니다. 연령가에 따라 일부 장면 및 스토리 전개가 상이할 수 있으니, 연령가를 선택 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추운 날, 나를 살리고 사람이 죽었다. 서준에게 그것은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1년간의 재활은 이겨냈으나, 불면과 죄책감은 이기지 못해 유가족을 찾았다. 서울의 마지막 산동네에서 ‘꽃잔치 국수’를 운영한다고. 그러나 그들을 마주했을 때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다시는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으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금께 손님을, 아니 손님께 소금을 뿌리려던 게……. 하아, 나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만남은 소금 한 바가지였다. “손님, 코트 벗어서 주세요.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털어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손님. 애가 좀 욱하는 성격이라 가끔 실수를 해요.” 제 예상과 달리 너무도 밝고 따스한 모녀에게 차마 제 정체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제가 그들의 가장을 죽게 만들었다고는. “아무튼, 김화영. 아르바이트 당장 그만두고 재수학원 알아봐.” 우연히 들은 대화로 결심했다. 화영이 대학에서 미래를 마음껏 꿈꾸게 돕고 떠나자고. 그러나 이런 마음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유서준 씨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좋아하게 됐어요. 유서준 씨를.” 그는 그녀에게 진실할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차게 식는 걸 볼 자신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