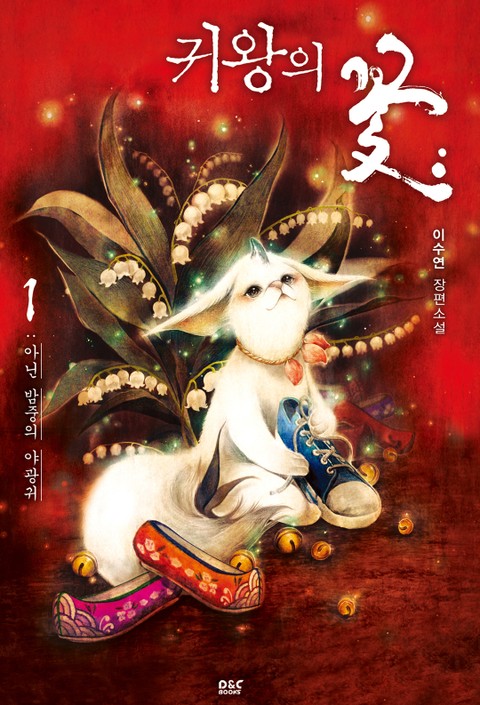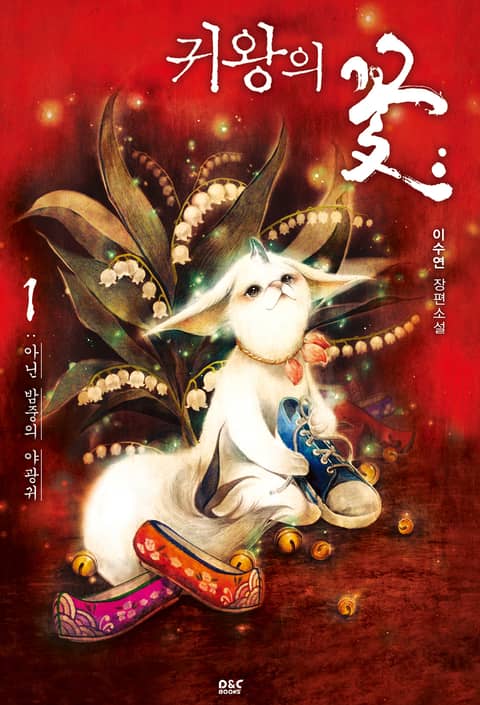이수연
<공중조각상> 바람이 그의 셔츠를 물결치게 했다. 바람은 또 한 번 불고 그의 윗옷이 벽걸이 달력처럼 펄럭였을 때 은유는 속을 슬쩍 볼 수 있었는데, 그 결과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세월이 흐른 흔적이었다. 어쩐지 은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많은 시간이 쌓인 것을 보는 건 왜인지 항상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다. 겨울날 모든 걸 뒤덮어 버릴 정도로 오래 내린 눈,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무너져 내린 유적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사람의 주름 까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챕터7, 이 틀을 넘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은유는 지문이 덕지덕지 붙은 창문을 손등으로 문질러 지워 보았다. 이러한 날씨에 창 앞에 서는 건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참 눈이 내릴 때 창밖을 내다보면 자연과 인간이 한 판의 바둑을 두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흰 눈은 흰 돌이 되어 아래로 내리고 우리의 검은 머리는 그에 지지 않게 맞서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승부는 언제나 검은 돌이 수세에 몰렸다가 결국엔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에선가 몰려오고 눈은 그치기 마련이었으니까. ‘눈이 쌓이면 사람들이 정말로 길이라고 여기는 곳이 어디인지가 밝혀진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곧바로 눈을 밀어내고 다시 길을 만들어 낼 테니.’ (챕터21, 셔틀콕과 누에고치 중에서) 천막을 친 큰 트럭이 차선을 바꿔 시인의 차 앞을 막아섰다. 그 트럭의 덩치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마치 트럭이 조금씩 풍경을 내어주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은유는 트럭이 칠칠치 못하게 흘리며 떨어트리고 간 풍경을 받아보는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트럭에는 나무며 햇살이며 하는 풍경들이 가득 실려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천막 안은 속이 보일 듯 말듯 해 더욱더 신비감을 주었다. (챕터38, 도시 중에서) 옷장이나 책장을 하나 처분한다면 그건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하나가 치워지는 것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의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야만 볼 수 있는 수만 개의 상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챕터53, 한 컷 안에 중에서)
<자화상 (RED)> 당신의 숨은 마음을 꺼내는 붉은 미술 작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세 개의 이야기, RED. 첫 번째 아야기, 자화상은 떠오르는 붉음을 의미하며 프리다 칼로의 ‘붉은 옷을 입은 자화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소설의 주인공은 사랑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성의 갈등과 마주침, 그리고 시작을 담으며 섬세한 마음의 선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에코르셰는 타오르는 정오의 붉음을 의미하며 베르나르 뷔페의 ‘에코르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소설 속에서 뷔페의 광대는 쾌락으로 뷔페의 작품 중 에코르셰는 프랑스어로 '가죽을 벗긴'이란 뜻으로 쾌락을 찾아가는 한 남성이 에코르셰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뷔페가 의미하는 광대에 관한 재해석과 쾌락이라는 달콤함의 끝을 담은 소설이다. 세 번째 이야기, 무제, 1970은 마크 로스코의 ‘무제, 1970’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소설 속에 담은 것은 마크 로스코의 신념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감각과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의문과 부정을 보여주며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